글 쓰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오는 동안에 가볍지 않은 세월이 쌓여가면서 받아 보는 책도 늘어나고, 읽어 보라며 보내오는 책들도 적지 않다. 다달이 또는 계절마다 오는 책이며 간간이 보내오는 책을 샅샅이 다 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글에 배어 있을 글쓴이의 정성을 기리며 많은 글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다. 어떤 글은 읽다가 보면 이름난 어떤 고전보다 더 감동을 주는 글이 있는가 하면, 읽느라 보내는 시간이 그리 보람되게 느껴지지 않는 글도 없지 않다. 글을 읽어나가는 사이에 마치 무엇에 이끌리듯 감동 속으로 젖어 들게 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감동에 다가가기도 전에 눈살이 먼저 찌푸려지는 글도 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어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 어휘나 문장이 보일 때 기대가 꺾여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글도 있다. 국어의 기초부터 잘 다지고 난 다음에 문장을 대해 주기를 바라고 싶은 글과 그런 필자들도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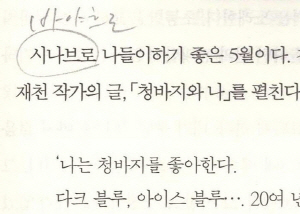 최근에 본 어느 수필 전문지에 좋은 수필을 소개하는 어느 유명 수필가의 글을 읽노라니 첫 문장부터 인상이 찌푸려진다. 그 글은 ‘시나브로 나들이하기 좋은 5월이다.’라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시나브로’가 적절하게 쓰인 어휘일까. 최근에 본 어느 수필 전문지에 좋은 수필을 소개하는 어느 유명 수필가의 글을 읽노라니 첫 문장부터 인상이 찌푸려진다. 그 글은 ‘시나브로 나들이하기 좋은 5월이다.’라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시나브로’가 적절하게 쓰인 어휘일까.
‘시나브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의 부사어로, 사전은 “바람은 불지 않았으나 낙엽이 시나브로 날려 발밑에 쌓이고 있었다.”와 같은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 문장의 ‘시나브로’는 잘못 쓰인 말일 것 같다. 혹 ‘이제 한창. 또는 지금 바로’라는 뜻의 ‘바야흐로’로 쓸 것을 잘 모르고 쓴 건 아닐까. 이 필자는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와 같은 문장도 쓰고 있다. ‘동대학원’은 어디에 있는 대학원일까. ‘동’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이라는 뜻의 ‘동(同)’이라는 관형사로 쓴 것이라면 띄어 써야 한다. ‘석사학위’라는 어휘도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문장은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로 띄어쓰기를 해야 맞지 않은가. 또 “노산 문학상, 한국 문학상, 신귀래 문학상(제1회), ’조경희 문학상 등 작가는 오직 수필의 길만 정진했다.” 상 이름이야 일일이 사전에 나올까만, 고유명사로 보아 이들은 모두 붙여 써야 옳다. 그리고 상 이름 뒤에 ‘등을 수상하며’라는 말쯤 넣어주고 다음 말을 이어야 할 것 같다.문장을 구성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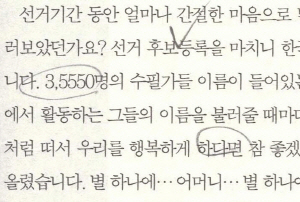 또 어떤 수필가는 문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고 그 소회를 밝히는 글을 월간 수필 전문지의 권두언으로 썼는데, 그런 내용의 글이 수필 전문지의 머리글로 적절할지도 의문이지만, 그 글 속에‘3,5550명의 수필가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다면 참 좋겠지요.’라는 표기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오타(誤打)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오타를 무심히 간과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글쓰기의 태도가 아니다. 또 어떤 수필가는 문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고 그 소회를 밝히는 글을 월간 수필 전문지의 권두언으로 썼는데, 그런 내용의 글이 수필 전문지의 머리글로 적절할지도 의문이지만, 그 글 속에‘3,5550명의 수필가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다면 참 좋겠지요.’라는 표기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오타(誤打)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오타를 무심히 간과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글쓰기의 태도가 아니다.
또한 이 필자는 ‘문단활동’ ‘무시당한’ ‘문화귀족’ ‘취급받는’ ‘일축당하니까요’ ‘나올법한’ 등으로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괘념하고 있지 않는 듯한 말을 남발하고 있다. “……고작 DESK로 가름하고 비방을 해야 할까요?”에서 ‘DESK’는 무슨 뜻일까. ‘책상’의 뜻으로 쓴 말이라면 굳이 영문 대문자로 써야 했을까. 무슨 다른 뜻이 있다면 풀이를 해주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 문자 그대로 표기하는 외래어나 외국어는 국어 문장 속에 쓰지 않는 일이 국어 문학인의 바른 자세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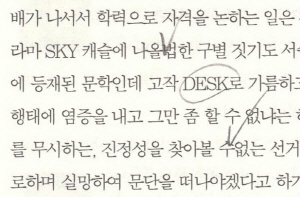 이 글을 쓴 이는 문단 선거에서 한 장르의 대표 문인으로 당선된 분이다. 문단의 비중 있는 중진으로 우리의 문학이며 수필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글 한 편을 써도 어떤 문학인보다 모범적인 문장을 쓸 수 있고, 국어 어휘를 정확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을 쓴 이는 문단 선거에서 한 장르의 대표 문인으로 당선된 분이다. 문단의 비중 있는 중진으로 우리의 문학이며 수필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글 한 편을 써도 어떤 문학인보다 모범적인 문장을 쓸 수 있고, 국어 어휘를 정확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그런 것에 강퍅하게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일반 언중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문학인은 더더욱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한 나라 국어에 있어서 음성언어의 표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이라면, 문자언어의 규범이 되어야 할 이는 문학인들이다. 문학인이 국어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국어는 발전할 수도 없고 제 가치를 발휘할 수도 없다. 
사실, 우리말의 어법과 문법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구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사용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말이나 그런 체계가 없지 않다. 국어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문학인이 잘못 쓴 말을 용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꾸준히 궁리하고 천착하여 바르게 쓸 수 있기를 애쓸 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말을 지키고 사랑하는 길이다. 문학인들이야말로 우리말 사랑을 운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 사랑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들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 바람은 나에게로도 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 사랑을 위하여 나는 이 순간에도 사전을 펼쳐 든다.♣(2019.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