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아침 산책길을 나선다. 볏짚들이 드러누워 있는 논의 가녘 두렁을 지나 마을 숲으로 든다. 들판도 모든 것을 다 비운 것처럼 나뭇가지도 내려 보낼 잎은 다 내려 보내고 맨살이 되어있다. 들판도 나무도 소곳이 사색에만 잠겨 있는 것 같다.  가지 사이에 하늘을 걸치고 있는 나무 아래에서 팔을 흔들기도 하고 벌리기도 하며 체조를 하고 강둑으로 올라선다. 찬연한 시절들은 다 어딜 갔는가. 해사하고 화사한 꽃들로 강둑길을 장식하던 봄날의 벚나무는 푸름 무성하던 철도 보내고 단풍이 곱던 철도 다 지나고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의 윤슬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가지 사이에 하늘을 걸치고 있는 나무 아래에서 팔을 흔들기도 하고 벌리기도 하며 체조를 하고 강둑으로 올라선다. 찬연한 시절들은 다 어딜 갔는가. 해사하고 화사한 꽃들로 강둑길을 장식하던 봄날의 벚나무는 푸름 무성하던 철도 보내고 단풍이 곱던 철도 다 지나고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의 윤슬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성성한 맨살로 서 있는 우람한 강둑 느티나무 노거수, 그 나무 아래의 정자도 호젓하다. 낙엽 몇 잎이 정자 마루를 뒹굴고 있다. 달맞이꽃이며 둥근잎유홍초며 사광이아재비며 그 숱한 풀꽃들도 자취를 감추고 강에는 마른 나뭇가지들만 은은한 그림자로 담겨 있다. 그 그림자를 쪼며 물오리들 몇 마리가 파문을 그리고 있다.  강둑길을 내려와 다시 들판 길을 걷는다. 들판이 아무 거리낌 없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있다.모든 것을 다 털어낸 노경의 어버이 모습 같기도 하고, 세사를 다 넘어서버린 노승의 모습 같기도 한 자태로 오직 하늘만을 바라며 편안히 누워있다. 할 일을 다 하고 나면,세상사를 다 넘어서고 나면 저리 편안한가. 그 강둑길이며 들판 길을 걸어 집으로 든다. 그 길의 속을 내가 걷다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내 속을 내가 걷다가 온 것 같기도 하다. 어찌하였거나 아침 산책길은 편안하고도 아늑하다.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내 삶이 다시 돌아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내가 저 나무들처럼 모든 걸 다 비우고 있는가. 내 삶이 저 들판처럼 저렇게 편안한가.  풍진의 한 생애를 마감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한촌을 찾아와, 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 삶을 산다며 정밀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서 몇 가을을 보내며 사는 사이에 나의 가을도 깊어 나목의 계절로 들고 있다. 그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가.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엮여져 왔던가. 내 삶이 어떻게 무늬져 왔던가. 풍진의 한 생애를 마감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한촌을 찾아와, 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 삶을 산다며 정밀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서 몇 가을을 보내며 사는 사이에 나의 가을도 깊어 나목의 계절로 들고 있다. 그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가.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엮여져 왔던가. 내 삶이 어떻게 무늬져 왔던가.
아침이면 산책길을 걷고, 집으로 들어 읽을 책을 읽고 쓸 글을 쓴다.텃밭을 가꾸는 재미로 살고 있는 아내의 보조 역할이긴 하지만, 어쩌다 흙을 쪼을 일이 있으면 쪼고 열매를 거둘 일이 있으면 거둔다. 흙을 일구는 재미로 살고 있는 아내와 산과 들의 풀꽃을 따라 살고 싶은 나는 사는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다 같이 자연을 즐기는 것이라 여기며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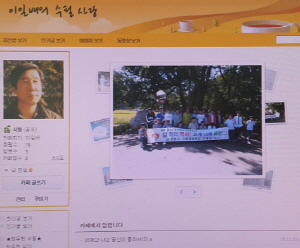 내가 사는 또 하나의 세상은 웹(web)이다. 그 속에도 내가 지은 집이며, 내가 관리해야 할 집이며,찾아가면 나를 반겨 주는 집이 몇 채 있다. 그 집의 곳간을 채우는 재미로, 쓸고 닦는 즐거움으로,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반가움으로 그 집을 지키고, 그 집들을 찾아간다. 그 웹 세상 또한 내가 사는 또 하나의 한촌이다.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해거름이면 다시 집을 나선다. 산을 오른다. 늘 만나는 나무들이지만 만날 때마다 반갑다. 나무는 늘 새로운 얼굴, 새 치장으로 반겨준다. 이렇게 새 단장으로 반겨주는 세상이 어디에 얼마나 있었던가. 그 산을 들면 언제나 아늑하다. 산에는 삶과 죽음이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다. 산 것도 죽은 것도 모두 같이 산다. 무엇에도 얽매임 없는 산이 정겹다.  땅거미 짙은 길을 따라 고샅으로 든다. 부르기도 하고, 불러주기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막걸리 잔을 함께 들며 살아오고 사는 이력이며 또 어떤 이력으로 살아야 할까도 이야기하고, 이웃의 따뜻하고 신기한 일들에 관한 소식이며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담론도 안주 삼아 불콰한 얼굴에 비소도 짓고 미소도 나눈다. 땅거미 짙은 길을 따라 고샅으로 든다. 부르기도 하고, 불러주기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막걸리 잔을 함께 들며 살아오고 사는 이력이며 또 어떤 이력으로 살아야 할까도 이야기하고, 이웃의 따뜻하고 신기한 일들에 관한 소식이며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담론도 안주 삼아 불콰한 얼굴에 비소도 짓고 미소도 나눈다.
거리낌 없이 편안(偏安)하다. 아침에 걸은 강둑길처럼 들길처럼, 해거름 산길을 함께 했던 나무처럼, 막걸리 잔으로 마주했던 사람들처럼 참 아늑하다. 내 한촌의 삶과 더불어 풍진의 세월 끝에 얻은 열매들일까.이 열매들이 주는 즐거움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누리며 살아도 좋은 걸까. 미국 시인 헨리 롱펠로(Henry Wadsworth Longfellow, 1807~1882)는 이런 시를 썼다고 한다. '노령은 젊음보다 못한 기회가 아니고/ 다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 저녁 황혼이 스러져갈 때/ 하늘은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로 가득하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별들이 뜰까. 낮에는,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별들이 뜰까. 강둑길에 비쳐오던 윤슬이 나의 별일까. 봄이 오면 다시 필 강둑길의 풀꽃들이, 늦가을 들판 같은 나의 마음이 별일까. 어떤 이는 황혼 뒤의 그 별로 칸트가 칠십 대 중반에 쓴 '인간학'을 들고, 미켈란젤로가 팔순을 넘기면서 성베드로 성당 천장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한 일화를 들려주고, 제임스 와트는 예순 넘어 독일어 공부를 시작하고 여든까지 발명했다는 사실을 말한다. 나는 지금 무얼 하며, 어떤 별을 보듬으며 살고 있는가. 내일도 아늑한 강둑길이며 고즈넉한 들길을 걸을 일밖에, 또 다른 새 얼굴로 맞아줄 내 숲정이의 나무를 안을 정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내 사는 건-.♣(201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