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가 나를 생각하며 쓴 글이라면서 수필 한 편을 보내왔다. 그 사이 간간이 만나기는 했지만, 영미를 생각하면 사십 년 가까운 옛 기억이 함께 떠오른다. 그 세월에 얹혀서 나는 종심(從心)의 기슭을 오르고 있고, 영미는 지명(知命)의 고갯마루를 넘어서고 있다. 어느 신문의 문학에 관한 기사에서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떠올리며 지난날을 그리워했단다.  그 때 영미는 고등학교 3학년, 내가 맡고 있는 학반의 실장이었다. 착한 성품에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여 친구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다. 나도 저를 굳게 믿으며 여러 가지 학급 일을 많이 시켰다. 무슨 일을 시켜도 싫어하는 기색 하나 없이 무던하게 해내곤 하던 영미였다. 영미가 보내온 글이 나를 울고 웃게 한다. 속절없이 가버린 세월이 눈물 나게 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던 소곳한 기억들이 웃음 짓게 한다. 나는 그때 욕심 많은 선생님이었단다. 다른 반보다 무엇이라도 나야한다며 실장인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지만, 늘 친구들 편에만 섰던 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며 걱정했다. 내가 그랬던가. 그 때 영미는 고등학교 3학년, 내가 맡고 있는 학반의 실장이었다. 착한 성품에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여 친구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다. 나도 저를 굳게 믿으며 여러 가지 학급 일을 많이 시켰다. 무슨 일을 시켜도 싫어하는 기색 하나 없이 무던하게 해내곤 하던 영미였다. 영미가 보내온 글이 나를 울고 웃게 한다. 속절없이 가버린 세월이 눈물 나게 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던 소곳한 기억들이 웃음 짓게 한다. 나는 그때 욕심 많은 선생님이었단다. 다른 반보다 무엇이라도 나야한다며 실장인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지만, 늘 친구들 편에만 섰던 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며 걱정했다. 내가 그랬던가.
어쩌면 그런 욕심은 내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영미의 말에 의하면 나의 퇴근은 또 다른 출근이 되어 밤낮을 저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때 나는 그것이 으레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였던지 영미는 우리 반 진학률이 제일 높았다고 자랑 삼아 회고한다. 그런 것에서 저들을 힘들게 했던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었을까.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영미의 영롱한 기억 하나가 또 나를 웃고 울게 한다. 그 때 아이들은 문화제 준비며 졸업앨범 제작 문제 등으로 실장들끼리 교내 매점에 모여 회의도 하고 일도 하면서 저희들 간식 비용을 애교 삼아 담임 앞으로 달아두기로 한 모양이었다. 담임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떠하실까 걱정도 하면서 다음에 매점에 가서 장부를 보니, 영미가 내 앞으로 단 그 외상값 아래 ‘더 먹지 그래’라며 다섯 글자를 적어 놓았더란다. 그 다섯 글자가 오십 자, 오백 자가 되어 자기를 격려해주어 친구들에게 어깨를 으쓱하게 했단다. 노발대발한 선생님도 없지 않았고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 지금까지도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내가 그렇게 한 일도 있었던가. 내 기억으로는 헤아려지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면, 딴은 아이들을 사랑하노라 하는 조그마한 마음이 요동했던 것 같다. 젊은 날의 해맑은 일들이 따뜻한 미소를 머금게 하고, 그런 일들을 기억의 심연 속에 묻어버린 세월이 눈물겹다. 영미는 또 내가 잊어버린 것을 잘도 기억하고 있다. 자취생이었던 영미가 토요일 오후에 점심도 먹지 못하고 먼 길을 가야하는 걸 보고, 내가 집으로 불러 아내를 시켜 점심을 먹여 보내더란다. 내가 그렇게 했다면 저의 성실성이 사랑스럽고 대견해서였을 것이다. 그 마음을 그때 영미가 알았을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미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나와 같은 전공의 국문과에 진학하였다. 국어가 좋더라고 했다. 대학을 마치자마자 바로 결혼하였는데, 결혼식에 내가 갈 수 없어서 아내를 보내어 축하해 주었던 것을 영미는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는 논술학원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전공을 살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연륜이 쌓이면서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글로 정리해 보고 싶어 수필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미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나와 같은 전공의 국문과에 진학하였다. 국어가 좋더라고 했다. 대학을 마치자마자 바로 결혼하였는데, 결혼식에 내가 갈 수 없어서 아내를 보내어 축하해 주었던 것을 영미는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는 논술학원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전공을 살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연륜이 쌓이면서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글로 정리해 보고 싶어 수필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그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어쩌다 간혹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오래 전 어느 날 산행 중에서, 울릉도 가는 선착장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내 아이 결혼식 때 찾아와 만나기도 하고, 한번 보자 하여 두 번을 만났다. 그중 한 번이 어느 해 ‘스승의 날’ 무렵 내가 재임 중인 학교에 찾아온 것이다. 한 반 친구 지인이하고 같이 와서 지난날을 함께 추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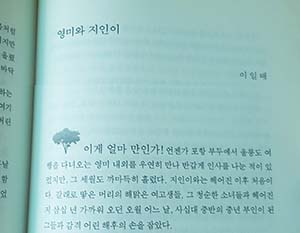 그 때 내 사무실에 감돌던 난향(蘭香)의 기억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 나를 생각나게 한다고도 했다. 그 난향의 사무실을 떠난 지도 강산이 변할 세월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날 영미와 지인이를 만난 감회를 ‘영미와 지인이’라는 제목의 글로 쓰기도 했는데, 그 글이 실린 책을 보내주었더니 그리 좋아할 수가 없었다. 이따금 전화 목소리를 나누면서 인연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나를 생각하며 쓴 글 한 편을 보내온 것이다. 그 때 내 사무실에 감돌던 난향(蘭香)의 기억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 나를 생각나게 한다고도 했다. 그 난향의 사무실을 떠난 지도 강산이 변할 세월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날 영미와 지인이를 만난 감회를 ‘영미와 지인이’라는 제목의 글로 쓰기도 했는데, 그 글이 실린 책을 보내주었더니 그리 좋아할 수가 없었다. 이따금 전화 목소리를 나누면서 인연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나를 생각하며 쓴 글 한 편을 보내온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글의 제목 ‘더 먹지 그래’는 영미가 보내온 글의 제목 그대로다. 영미가 일깨워준 기억의 그때를 돌아보니 내 생애에 몇 안 되는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 시절을 기리고 싶어 저의 글 제목 그대로를 나의 글제로 삼았다.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어찌 올 수 있으랴만, 내 남은 세월 어디쯤에 그런 아름다운 기억 몇 자락쯤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영미의 글은 “내 눈에 비친 선생님은 피부에서도, 영혼에서도 모두 주름살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모습에 나를 비춰 본다.”라며 끝맺고 있다. 민연한 말이다. 영미의 말처럼 주름살 없는 영혼 되어 살다가 맑은 모습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혼에 주름살이 없을 사람은 오히려 영미일 것 같다. 그 도타운 마음은 영미를 청옥같이 맑은 영혼으로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나의 인연 속에 맑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영미가 있는 것만 해도 내 영혼 어디쯤 한 자락은 맑아질 수 있을 것 같다.♣(2018.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