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서트가 끝났다. 공연장을 뜨겁게 달구던 관객들이 다 빠져나간 빈  무대에 섰다. 탄성과 갈채의 환영이 안개처럼 공연장을 감돌고 있다. 오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했던가. 잠시 시를 외고 수필을 읽었다. 그 한 순간들을 위해 얼마나 애를 태우며 열정을 끓여 왔던가. 무대에 섰다. 탄성과 갈채의 환영이 안개처럼 공연장을 감돌고 있다. 오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했던가. 잠시 시를 외고 수필을 읽었다. 그 한 순간들을 위해 얼마나 애를 태우며 열정을 끓여 왔던가.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 혼자서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시 외기에 쏟았지만, 스물두 번이나 모여 함께 호흡을 가다듬었다. 외기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퍼포먼스가 중심이 된 이 번 콘서트를 위해서 낭송과 함께 적절한 연기도 익혀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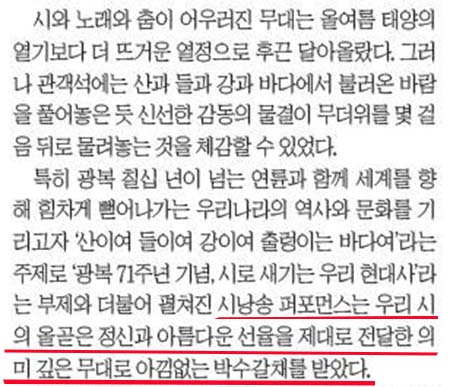 그 열정이 보람이 된 것일까? 며칠 뒤 어느 신문 칼럼에서 우리의 콘서트를 두고 ‘우리 시의 올곧은 정신과 아름다운 선율을 제대로 전달한 의미 깊은 무대’였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큰 무대가 마련되었더라면’(대구일보, 2016.8.24.) 더욱 좋았을 것이라며 찬사를 보내주었다. 그 열정이 보람이 된 것일까? 며칠 뒤 어느 신문 칼럼에서 우리의 콘서트를 두고 ‘우리 시의 올곧은 정신과 아름다운 선율을 제대로 전달한 의미 깊은 무대’였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큰 무대가 마련되었더라면’(대구일보, 2016.8.24.) 더욱 좋았을 것이라며 찬사를 보내주었다.
그 칼럼을 보는 순간 관객이 떠난 빈 객석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허전함을 헤치고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듯한 희열감과 함께 시 외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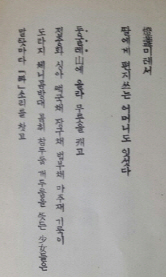 골몰했던 지난날들이 오롯이 떠올랐다. 골몰했던 지난날들이 오롯이 떠올랐다.
내가 낭송해야 할 시는 노천명의 ‘망향’이다. 화합할 수 없는 도회 생활 속에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애잔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다. 향수를 자극하는 소재로, 아이들이 즐겨 따던 ‘하눌타리’며 접중화, 싱아, 뻐꾹채, 장구채. 범부채, 마주재, 기룩이, 도라지, 체니 곰방대, 곰취, 참두릅 개두릅 등 많은 풀꽃들이 등장하는데, 외기 전에 먼저 시가 풍기는 분위기에 젖기 위해 그 풀꽃들을 찾아보려 애썼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함경도 사투리인 듯한 ‘마주재, 기룩이, 체니 곰방대’가 어떤 풀꽃인지 끝내 알 수 없어 먹먹해 하던 차에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범부채와 하눌타리를 우연한 기회에 직접 볼 수 있어서 외기에 한층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이해가 어려운 구절은 현대시를 전공한 어느 대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함께 모여서 낭송 전문가인 회장님에게 지도를 받아가면서 외기도 했지만, 산책길을 걸으면서도 외고, 산을 오르면서도 외고, 자전거를 달리면서도 외었다. 구절을 빠뜨림 없이 정확하게 외야기도 하지만, 그 구절들에 서려 있는 시인의 감정 혹은 내가 느끼고 이해하는 감정을 살려 외기에도 공을 들여야 했다. 함께 모여서 낭송 전문가인 회장님에게 지도를 받아가면서 외기도 했지만, 산책길을 걸으면서도 외고, 산을 오르면서도 외고, 자전거를 달리면서도 외었다. 구절을 빠뜨림 없이 정확하게 외야기도 하지만, 그 구절들에 서려 있는 시인의 감정 혹은 내가 느끼고 이해하는 감정을 살려 외기에도 공을 들여야 했다.
나에게는 자작 수필 낭독 순서도 있었다. 여 회원과 나누어 듀엣으로 낭독하기로 했다. 낭독이라 하지만 그냥 읽을 수만은 없는 일, 한층 매끄러운 낭독이 되기 위해서는 시처럼 외어야 했다. 구절마다 적절한 정감을 살리기에도 마음을 모아야 하지만, 둘이서 호흡을 맞추어 가며 낭독하기도 소홀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몇 달을 두고 외기에 몰두하는 사이에, 외는 일은 온통 내 일과의 모든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글이 안고 있는 분위기를 잘 살려 가며 외는 일만이 오직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온 마음을 모았다.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드디어 무대에 설 시간이 다가 왔다. 그토록 모든 것을 바쳐왔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주 멋지게 낭송하고 낭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리허설을 거쳐 무대에 섰을 때, 마냥 내 자신감과 같지는 않았다. 관객의 수많은 눈길에, 휘황한 조명에 내가 빨려 들어가고 말 것만 같았다. 하얘지려는 머릿속을 어렵게 수습하며 겨우 낭송, 낭독을 해내었다.
 콘서트가 끝나고. 관객들이 빠져나간 무대에는 낭자한 꽃다발과 함께 정적만 남았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버린 듯했다. 주저앉고 싶었다. 시를 외기 위한 지난 시간들의 길이와 깊이만큼 공허감도 크고 깊게 밀려왔다. 그래, 콘서트가 이번만은 아니었잖아. 끝날 때마다 느꼈던 기분이잖아. 옷깃을 다시 여미고 허전한 마음 자락을 추스르며 무대를 내려왔다. 콘서트가 끝나고. 관객들이 빠져나간 무대에는 낭자한 꽃다발과 함께 정적만 남았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버린 듯했다. 주저앉고 싶었다. 시를 외기 위한 지난 시간들의 길이와 깊이만큼 공허감도 크고 깊게 밀려왔다. 그래, 콘서트가 이번만은 아니었잖아. 끝날 때마다 느꼈던 기분이잖아. 옷깃을 다시 여미고 허전한 마음 자락을 추스르며 무대를 내려왔다.
콘서트의 날이 지나고, 다시 아침 산책길을 나섰다. 마을 숲에서 운동을 하고 강둑 풀숲 길을 걷는다. 운동기구를 돌리며 외던 수필이며, 강둑을 걸으며 외던 시-. 이제 뭘 외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생업을 걸던 일터에서 밀려난 심정이 이러할까.
아, 그런 것들이 내게 있었지. 지난 몇 번의 콘서트를 위해 외웠던 시들이며 수필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평소 내가 즐겨 외던 시들도 흘러갔다. 조병화의 ‘서로 그립다는 것은’도 있고, 조창환의 ‘나는 늙으려고’, 정일근의 ‘기다린다는 것에 대하여’, 이문재의 ‘오래된 기도’도 있고, 내 수필 ‘생일 풍경’, ‘샐비어’, ‘산의 가슴’도 있지 않은가. 어찌 그것들 만이랴.
이번 콘서트에 몰두하느라 그런 것들을 기억의 한쪽 자리로 밀쳐두고 있었다. 한동안 잠재워 두고 있었던 시며 수필들을 기억 속에서 다시 불러내었다. 먼지가 앉아있는 것은 털어내며 다시 새겼다. 기억이 끊어진 부분들은 원문을 찾아보며 살려내었다. 나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콘서트가 끝날 때마다 느끼던 허전함은 바로 나의 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통과의례였던가 콘서트가 끝날 때마다 느끼던 허전함은 바로 나의 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통과의례였던가
그 허전함이 있었기에 나는 많은 시며 수필들을 가질 수가 있었다. 힘들었던 콘서트가 고마워지고, 허전했던 마음이 생기로워진다. 시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낭송 모임의 좋은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그립다.
나는 지금 모든 속진들을 떨친 채 산이며 강이 있는 마을을, 바람소리며 새소리가 맑은 한촌을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다. 나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내 속에 들어있는 시며 수필보다 더 값진 재산이 또 무엇이 있을까?
또 어떤 것이 나의 아름다운 재산일 수 있을까?♣(2016.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