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호와 갈채로 출렁이던 콘서트가 끝났다. 관객들은 돌아가고 객석은 비었다. 모두들 꿈결 같은 기억만을 안은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 주말마다 모여 빗줄기 땀을 흘리면서 목소리며 가락을 가다듬던 일도 멀어져 갔다.  아침 산책길을 걸으며, 해거름 산을 오르며 부지런히 시를 외고, 잠결 속에서도 사뭇 시를 외며 숨을 고르던 나의 모습도 흘러간 시간 속의 일로 아련해지려 할 무렵, 무대 장면들이 살아있는 영상이 되어 날아왔다. 무대에 올라 시를 외고 박수를 받으며 내려오던 일들이 흐르는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침 산책길을 걸으며, 해거름 산을 오르며 부지런히 시를 외고, 잠결 속에서도 사뭇 시를 외며 숨을 고르던 나의 모습도 흘러간 시간 속의 일로 아련해지려 할 무렵, 무대 장면들이 살아있는 영상이 되어 날아왔다. 무대에 올라 시를 외고 박수를 받으며 내려오던 일들이 흐르는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는 그때 여 회원과 함께 등장하여 황지우 시인의 ‘거울에 비친 괘종시계’를 외었다. 중년을 넘는 나이를 살면서도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보는 내용의 시였다. 중년은커녕 한껏 황혼기를 살면서도 이렇다 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비추어보며 선택한 시다. 여 회원이 시 속의 아내 역할을 맡았다. 
열심히 외고 다듬은 대로 낭송하기를 애썼다. 강조해야 할 부분은 높이를 조절하고, 감정을 세워야 할 부분에는 목소리의 빛깔을 달리하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받고는 비감한 소리로 답을 해나갔다.
낭송이 끝나고 여 회원과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올 때 갈채가 쏟아졌다. 황홀감이 몸을 감았다. 무대는 몇 사람의 합송과 대금 연주, 시극 순으로 흘러가면서 다시 내가 여 회원과 함께 등장하여 자작 수필을 낭독하는 순서에 이르렀다. 여 회원과 단락을 주고받으며 그리움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풀어나갔다. 낭독이 끝나고 관객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낭송도, 낭독도 모든 것이 잘 풀려진 줄 알았다.  그 날의 모든 장면들이 담긴 영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오늘은 내가 나의 관객이다. 회장님의 독송이며 몇 회원이 함께 하는 윤송의 장면들이 아름답고도 정감 깊게 흘러갔다. 드디어 내 모습을 마주했을 때, ‘어, 저 게 아닌데….’나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왔다. 저 게 내 모습이란 말인가. 내 목소리요, 나의 억양이란 말인가. 그 날의 모든 장면들이 담긴 영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오늘은 내가 나의 관객이다. 회장님의 독송이며 몇 회원이 함께 하는 윤송의 장면들이 아름답고도 정감 깊게 흘러갔다. 드디어 내 모습을 마주했을 때, ‘어, 저 게 아닌데….’나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왔다. 저 게 내 모습이란 말인가. 내 목소리요, 나의 억양이란 말인가.
문득 ‘채근담(菜根譚)’의 “배우는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어 붓 끝으로 고움과 미움을 이루지만, 이윽고 노래가 끝나고 막이 내리면 곱고 미움이 어디 있겠는가.”(제99장)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다. 연기가 끝나고 막이 내려도 배우의 곱고 미움은 고스란히 남은 것 같았다. 고운 모습은 가라앉고 미운 모습만 오롯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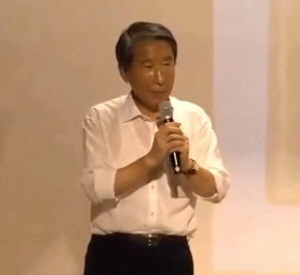 내가 낭송했던 ‘거울에 비친 괘종시계’가 오늘은 나의 거울이 되어 내 앞에 걸려있다. ‘나 이번 생은 베렸어’에서 끝은 왜 저리 맥없이 내려가는가. ‘베린(버린)’ 생이 한스러워 그러한가. ‘이 다음 세상에선 우리 만나지 말자’ 무엇이 그리 급했던가. 말하기가 두려웠던가. 그 뿐 아니다. ‘그 닳아빠진 품목들을 베끼고 있는 거울’이라 할 때는 쉼[休止]과 호흡을 그리도 못 맞추었던가. ‘낡은 괘종시계가 오후 두 시를 쳤을 때 그는 깨달은 사람이다.’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인가. 깨달은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왜 그리 황망했을까.  저 목소리는 또 무엇인가. 잠겨 있다가 가까스로 나오는 소리 같다. 시의 분위기를 살려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얼굴이 달아오른다. 관객은 어떻게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 무슨 마음을 담아 갈채를 보냈을까. 저 목소리는 또 무엇인가. 잠겨 있다가 가까스로 나오는 소리 같다. 시의 분위기를 살려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얼굴이 달아오른다. 관객은 어떻게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 무슨 마음을 담아 갈채를 보냈을까.
저 모습이 그리 많은 날, 오랜 시간을 두고 외며 다듬은 결과란 말인가. 시의 말처럼 ‘이 삶이 담긴 연약한 막(膜)’이 느껴진다. ‘2미터만 걸어가면 가스 밸브가 있고, 3미터만 걸어가면 15층 베란다가 있다.’는 시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긴장이 나를 눌렀던가 보다.혼자서는 잘 하던 일도 남 앞에만 서면 얼고 작아지는 소심증 탓일까. 얼마를 더 살아야 마음이 커질 수가 있을까. 심신이 어떻게 더 닦여야 큰마음으로 남 앞에 설 수 있을까. 돌아보면, 내 살아온 일들이 늘 그랬던 것 같다. 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어설프고 덩둘하게 살아왔던 것 같다. 그렇게 살아온 이력이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하다 보니 번듯하게 이룬 것 별로 없이 이리 작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난날을 한하고 싶지는 않다. 해놓은 일 하나 제대로 없을지라도 지금 나에게는 오를 산이며 걸을 강둑이 있고, 들을 새소리며 느낄 바람 내음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것들이 내가 이루어놓은 가장 큰 일인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내 곁에는 항상 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난날을 한하고 싶지는 않다. 해놓은 일 하나 제대로 없을지라도 지금 나에게는 오를 산이며 걸을 강둑이 있고, 들을 새소리며 느낄 바람 내음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것들이 내가 이루어놓은 가장 큰 일인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내 곁에는 항상 시가 있지 않은가.
시를 외는 마음속에는 샘물 같은 청량감이 있고 잉걸불 같은 따뜻함이 있다. 아릿한 그리움이 있고 소곳한 사랑이 있다. 시를 외면 얽히고설켜 있던 마음도 한 가닥 올곧은 실로 풀어지고, 아린 마음도 화기가 되고,끓던 분노도 화평으로 가라앉는다. 남 앞에서 좀 못 외면 어떤가. 외고 싶은 시를 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관객은 나의 낭송 기술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담겨 있는 내 마음에 젖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얼굴을 달게 했던 그 무대조차도 그리움이 되어간다. 또 몇 줄의 시를 왼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세상의 길이란 길/ 끝에서는, 삭은 두엄 냄새 같은, 편안한/ 잠 만날 줄 알았건만 아직 얼마나 더/ 기다려야 저 기막힌 그리움/ 벗어 놓는단 말인가”(조창환,‘나는 늙으려고’)♣(201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