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불국사에 가면 아사달 아사녀의 사랑의 나무가 있다. 불국사 일주문에서 천왕문을 지나 영지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 단풍나무 숲길로 올라가다가 보면 연리근(連理根)으로 얽혀 있는 진귀한 모습의 나무들을 볼 수 있다.

수령이 이백여 년쯤 된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서로 뿌리를 얽고 있는 품이 참 열렬하고도 애절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발견된 것이지만, 그 모습이 영지에 어려 있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연상케 하여 ‘사랑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참으로 진귀하다. 소나무과의 상록교목과 느릅나무과의 활엽교목으로 태생도 속성도 전혀 다른 두 나무가 뿌리를 그토록 애틋하게 엮어 오랜 세월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습이며 성질이 서로 다른 것들도 저리 정겹게 얽혀 살 수가 있다는 것이 감탄스럽다.
사람살이가 돌아 보인다. 세상에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시샘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 저마다의 생각과 사정은 있을 터이지만, 서로의 마음과 뜻을 껴안지 못해 갈등과 분열과 증오의 가시밭길을 스스로 걷고 있는 사람의 일 또한 어찌할까.
좀 다른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문학지들을 읽노라니 한 작가의 같은 작품을 두고, 평자들의 전혀 다른 비평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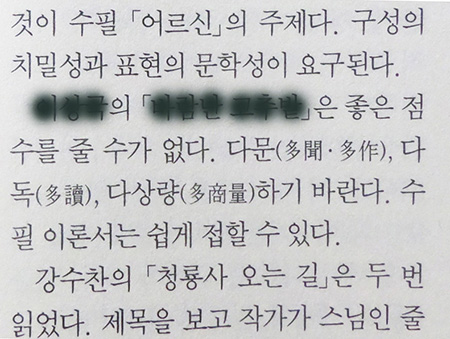
어떤 평자는 “ㅇㅇㅇ의 「ㅇㅇㅇ ㅇㅇㅇ」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다문(多聞, 多作), 다독(多讀), 다상량(多商量)하기 바란다. 수필 이론서는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평하여 초보적인 수준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내리면서 작자의 얼굴이 화끈 달게 할 만큼 혹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어떤 평자는 ‘이 작품은 …… 문학의 본질적 실체에 관한 확인을 다시해 볼 것을 주문하는’, 시적 은유와 상징으로 이루진 <산문의 시> 문학으로, 매우 아름다운 사랑표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렇듯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평가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극명하게 잘못 읽은 것이거나, 현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남의 작품을 평할 수 있는 처지라면 읽기의 기본 자질은 갖추어진 이들이라고 볼 때 관점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 차이 때문에 한 작품을 형편없이 망가뜨리거나 가치를 과장되게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관점의 차이가 심지어는 세상을 뒤흔들어 큰 파란을 일게하는 일도 왕왕 본다. 최근에 무슨 교과서 문제 때문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고, 그 들썩임은 큰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2352:0’이란 숫자가 신문에 보인다. 무슨 이념을 바탕으로 저술된 교과서들 측의 사람들이 자기네들과 다른 생각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채택을 훼방하여 수많은 학교들 중에 한 학교도 그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후까지 버티던 어느 시골의 조그만 사립 여학교도 집요한 압박에 결국은 채택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 ‘2352:0’이란 숫자가 신문에 보인다. 무슨 이념을 바탕으로 저술된 교과서들 측의 사람들이 자기네들과 다른 생각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채택을 훼방하여 수많은 학교들 중에 한 학교도 그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후까지 버티던 어느 시골의 조그만 사립 여학교도 집요한 압박에 결국은 채택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
불국사의 ‘사랑의 나무’처럼 서로 얽혀 정답게 살 수는 없을까. 나의 관점과 이념이 소중하면 남의 그것들도 존중해 줄 수 없을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보노라면 너무도 순진한 바람일지도 모르겠다. 어느 한 시 한 때도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문득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그리움의 기억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저 나무에게나 물어보리라”
-박주택, ‘하루에게’
내 존재의 이유를 ‘저 나무에게나 물어 보리라’고 했다. 시인의 속내를 실히 모르기는 하되. 혹 내 존재의 의의를 인간 사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절망스런 절규는 아닐지? 사실 늘 싸움만 하고 서로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걸 수 있을 것인가. 
뿌리를 정겹게 서로 얽고 있는 불국사의 ‘사랑의 나무’를 보라, 어찌 불국사의 나무만이랴. 나무들은 누가 누구를 원망도 시기도 하지 않고 서로 얽히고설켜서 살고 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 뿐, 묵묵하고 꿋꿋하게 그들의 세상을 피워 나가고 있다.
아, 참 다행이다. 내가 사는 한촌에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묵묵하지만 정겨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한나절만 보이지 않아도 안부를 궁금해 하는 정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서로 가지를 얽고 오순도순 살고 있다.
저 나무들에게나 물어보아야겠다. 아니, 나무 같은 이웃들에게 물어보아야겠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201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