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생애를 정리한 문집을 펴냈다. 아버지의 일생을 담은 글 뒤에 가족사를 이야기한 수필 몇 편을 함께 실었다. 원고를 쓴 것은 아버지가 영면에 드신 지 십 주기가 되어 갈 무렵이었다. 원고는 어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어머니는 이십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때는 성성한 세월을 안으신 채로 눈물어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살고 계실 때는 그런 글을 쓸 생각을 못했다. 아버지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만 여겼다. 아니, 그런 상념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사는 이력이 쌓이면서 세상의 풍진을 겪어가는 사이에 숱한 난관을 투지로 헤쳐 오셨던 아버지의 생애가 돌아보일 때가 많았다. 아버지는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 이듬해 태어나셨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공간의 혼란상이며 6.25전쟁과 더불어 숨 가쁘게 요동쳐온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오롯이 겪으며 10.26사태(대통령 서거, 1979)를 만 하루 지난 다음날 새벽에 운명하시기까지 집안의 갖은 골곡과 함께 참담한 시대고(時代苦)를 온몸으로 부딪쳐내며 살아오셨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역사가 새겨줄 사회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다. 이 땅의 평범한 백성으로, 한 집안의 아들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오셨을 뿐이지만, 아버지의 평생에는 늘 시대의 그림자가 따라다녔고, 그것은 아버지에게 갖은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시련들이 아버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15세 때 기차가 다니는 곳으로 성취(成娶)하는 바람에 신문물에 눈을 떠 일본으로 만주로 거친 발걸음을 들놓으셔야 했고, 그 걸음은 곧 아버지의 꿈과 삶을 찾아가는 고행의 발길이었다. 해방 공간 속에서는 <10.1사건>의 여파로 참혹한 고초를 겪으시다가, 이어서 발발한 동족상잔 전쟁으로 피란살이의 참혹한 고난을 안으셔야 했고, 그 세월과 더불어 얻은 신양(身恙)으로 말할 수 없는 신고를 겪으시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 어려움에 결코 굴하지 않았다. 기꺼이 도전하며 투지를 다하여 헤쳐 나가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아들로 하여금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생애를 물었다. 어머니는 함께 겪어온 풍파의 세월을 눈물겨워도 하시면서 곡진한 사연으로 풀어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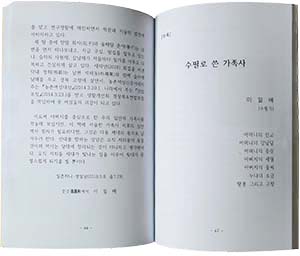 아버지가 삶의 준령(峻嶺)을 넘으실 때마다 어머니인들 고초가 왜 없었을까. 아버지의 고난과 고초는 곧 어머니의 것이기도 했다. 어쩌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모진 삶을 살아오셨는지도 모른다.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고초를 머금으며 나고 크고 살아왔다. 어느 집인들 그렇지 않으랴만, 원고에 담긴 두 분의 생애를 보면 그 고초가 여느 집보다 더욱 컸을 것 같다. 그 절절한 사연들을 머릿속에만 넣어둘 수 없어 원고지에 적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 원고를 고이 품고 있는 사이에 30여 년이 어느새 흘러갔다. 그 세월 속에서 어머니는 한(恨)도 남았을 세상을 떠나시고,나도 굽이진 삶의 곡절과 사연들을 넘어 한 생애를 마감하고 노을빛과 더불어 살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 원고를 이대로 껴안고만 있다가는 두 분 삶의 내력이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 것 같았다. 생명을 존재하게 한 생명의 사연들을 무심한 망각 속에 묻어버리는 건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늦으나마 실물적인 기록으로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붙이들에게만이라도 전해주어 부모님에게서 받은 삶이 나를 거쳐 어떻게 저들에게로 갔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동기간이며 아이들과 함께 갈라볼 수 있을 만큼만 만들었다. 이 책을 아이들에게 주려는 것은 나의 오늘을 저들에게 주는 것이고, 저들의 오늘을 다시 새겨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임은 물론이다. 오늘이란 하고많은 어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었고, 내일의 어제가 될 것이 아닌가. 어제 없는 오늘이 어찌 있을 수 있으며, 오늘 없는 내일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비 어미를 찾아 올 것이다. 이 책을 안겨주면 아이는 거기에 저의 오늘과 내일이 담겨 있음을 알까. 이 책을 안겨주는 아비의 마음을 알까.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의 어제였고 저들이 맞고 있는 오늘의 근거임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용히 새겨보면 민연(憫然)한 일이기도 하다. 저들의 오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던가. 아버지 어머니의 가족을 위한 파란으로 굽이진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저들을 위해 그리 노심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때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조그만 위안이다. 오는 추석 차례 상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는 문집을 올리고 간곡한 배례(拜禮)를 드려야겠다. 어떤 심사로 내려다보실까. 가난한 나의 오늘이 또 흘러가고 있다. 어제의 내일이 또 어제가 될 내일로 가고 있다.♣(2018.9.2. 양력 생일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