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가 제 발로 산에서 내려올 리가 없다. 산은 나무의 태생 고향이요, 집이요, 보금자리요,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무가 들판에 내려앉아 있고, 길가에 나앉아 있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람 탓이다. 사람들이 산의 나무를 들어다가 저들이 일하는 들판에도 앉히고, 저들이 다니는 길가에도 앉히고, 저들이 사는 집 뜰에도 앉힌다. 사람들은 나무를 저들이 차지한 땅에 들이기를 좋아한다. 어느 때는 못 들여서 안달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에게 왜 그러는 것일까. 아껴주기 위해서인가. 치장을 위해서인가. 이득을 위해서인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리하든, 어떻게 해주든 나무의 본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나무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무는 사람의 그 아낌이라는 게 무언지도 모른다. 잎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은 저의 삶일 뿐 장식이 아니다. 나무는 누구네 집 소출이 되어 곳간을 채우거나, 아궁이의 땔감이 되기 위해 사는 건 아니다. 나무는 오직 나무로 나고, 나무로 숨 쉬고, 나무로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사람들은 나무들을 소용에 따라 저들이 살고 쓰는 땅에 옮겨다 놓고는 편하게 살도록도 해주지 않는다. 아니, 나무는 ‘편하게’ 살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두면 된다. 옮기지 말고 그냥 두면 좋지만, 옮겼더라도 그냥 두면 된다.

제 땅에서 파내어 남의 땅에 데려왔으니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살펴주어야 하겠지만, 뿌리만 박히면 땅속의 자양을 스스로 찾아가며 살 수 있다. 나무는 그냥 살고 싶다. 생긴 모습 그대로, 바람이 불면 일렁이는 대로, 가지가 돋으면 돋는 그대로 살고 싶다.
가지가 너무 벌었다고 베고, 모양이 안 난다고 치고, 눈 앞을 가린다고 잘라버린다. 길을 낸다고 파내어버리고, 무얼 짓는다고 없애버리고, 쓸만하게 컸다고 베어 쓸 데에 써버린다. 나무도 사람들과 같이 산목숨임을 왜 몰라 주는가.
물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진실로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무가 풍겨내는 평안과 위안을 받는 사람도 있다. 나무는 남을 편안하게 하는 천품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나무를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나무에게서, 혹은 나무를 기회로 곧장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나무를 없애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그 나무들이 지닌 천성이야 어떻든 가차 없이 처단해 버리고, 무성한 숲도 일거에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1990년대 미국에서는 ‘목재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을까.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얼마 남지 않는 숲을 무분별하게 벌목을 해대는 벌목꾼에 맞서 자기 몸을 나무에 묶어가며 싸웠다.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업무방해죄로 재판정에도 서고, 감옥에서 종신형을 치르는 사람도 있었다.
마구잡이로 나무를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무다. 아름드리 큰 나무다. 땅을 지키고 하늘을 지키고 모든 생명을 지키는 우람한 노거수다.
사실, 나무는 사람의 사랑도 바라지 않는다. 태어날 때도 하늘을 따라 흙과 바람에 안겨 났듯 그렇게 살면 된다. 그대로 두면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의 일 아니던가. ‘도법자연(道法自然)’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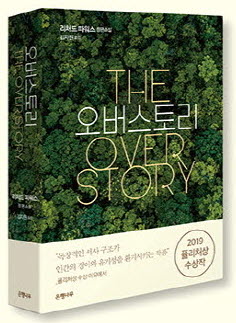
미국의 목재 전쟁을 그리고 있는 리처드 파워스(Richard Powers)의 소설 ‘오버스토리(The Over Story)’에 이런 말이 나온다.
“개간된 땅에 숲을 되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훌륭하고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시간 안에 될 것이다.”
‘개발’이라는 좋은 이름을 달고 땅이며 숲을 무참하게 파헤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설령 그렇게 된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자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하늘이 나무도 나게 하고 풀꽃도 피게 한다는 것이다. 그대는 경작지를 몇 해 그냥 두어본 적이 있는가.
그대로 두면 된다. 그대로 두면 나무는 산다. 죽어서도 산다. 죽은 자리가 곧 날 자리기 때문이다. 나무는 죽어서도 제 노릇이 있고, 그 노릇 다하면 다시 태어난다. 그런 나무를 그냥 두지 못하는가. 자꾸만 파내고 베어내려고 하는가.
나이테를 하나하나 그으며 나름의 온갖 유래와 사연을 간직해 가고 있는 나무를, 알게 모르게 사람이며 모든 것에 평안과 위안을 주는 나무를,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을 위하여 함부로 자르고 베어내고 있다.

멀쩡한 원전을 내치고 태양광이라는 괴물을 치키면서 수많은 숲을 해치고 나무를 잘라내는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나무가 사라진 땅에서 태양광의 빛과 열을 누리는 것만으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 나무가 없는 땅에서도 뭇 목숨이 숨을 제대로 쉬며 살 수 있을까.
그냥 두자. 그대로 두자. 누가 우리를 침노함이 없이 고요히 두기를 바라듯 나무도 그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나무도 우리와 더불어 살고 함께 숨 쉬어야 할 어엿한 생명체가 아니던가.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생물을 살리고/ 만물 중에 제일 이쁘고 높은// 나무여/ 생명의 원천이여”(정현종, 「나무여」)라 하지 않는가.
나무, 그대로 두자.♣(2019.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