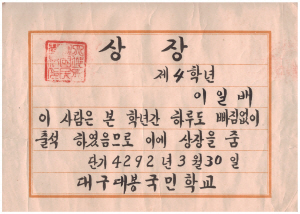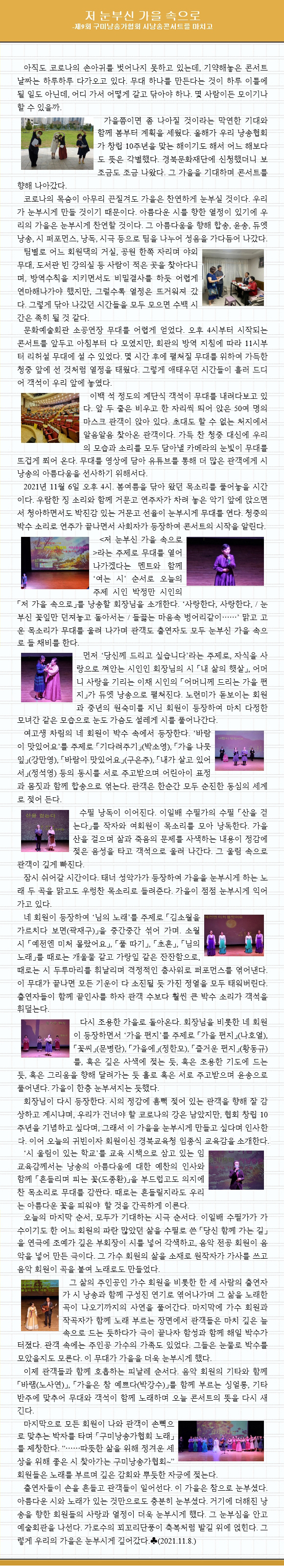상장 모정 설날 큰댁에서 차례를 모시고 둘러앉아 음복하는데, 형수께서 누렇게 변색한 두루마리 뭉치를 내놓으며 나에게 건넸다.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 깊숙이 들어있더라 했다. 하도 오래 돌돌 말려 있던 것이라 잘 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펴다간 으스러질 것 같아 조심조심 펼쳤다. 깜짝 놀랐다. 단기 4292년이면 서기로 1959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서 받은 개근상장에 적힌 연도다. 그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내가 받은 상장들이 고스란히 말려 있었다. 지금부터 63년 전에서 55년 전에까지 받은 것이니까 모두 반세기가 훨씬 지난 것들이다. 특출하게 빛나는 상장은 없었지만, 개근상 정근상은 거의 놓치지 않은 것 같다. 그중에는 국민(초등)학교 졸업장이며 고등학교 때 교내 백일장에서 받은 상장,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