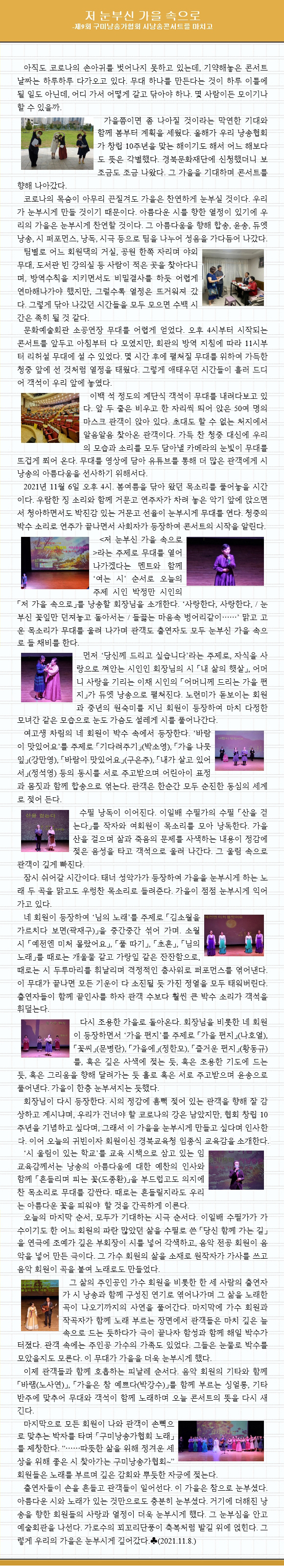엉겅퀴 사연
엉겅퀴 사연 이 일 배 오늘도 산을 오른다. 녹음이 무성하다. 수풀이 우거진 어귀 오솔길을 오르는데 무엇이 바짓가랑이를 찌르듯이 잡는다. 놀라 돌아보니 엉겅퀴다. 날마다 걷는 길인데 오늘 나를 잡을까. 이제 비로소 꽃을 피웠노라며 저를 봐달라는 말인가.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꽃이 수술일지 꽃잎일지 모를 가시를 뾰족뾰족 뽑아 올리며 함초롬히 피어 있다. 붉은빛, 분홍빛, 자줏빛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송이를 이루고, 흰색으로 뻗어 올린 피침 하나하나에 붉은빛을 감고 있다. 줄기에도 잎에도 잔털이 송송 나 있고, 잎은 양쪽으로 깊게 갈라지면서 끝에 뾰족한 가시를 달고 있다. 그 가시가 나를 잡은 것이다. 꽃의 빛깔이며 생김새도, 가시가 나 있는 잎이며 줄기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