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산을 오른다. 늘 그 자리에 서서 하늘 향해 푸른 가지를 뻗고 서 있는 나무들이 언제 봐도 아늑하고 청량하다. 잎사귀를 반짝이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나도 저를 향해 즐거운 손길을 보낸다.
강대나무가 된 소나무 하나가 넘어지면서 상수리나무에 기대어 서있다. 뿌리가 뽑힌 밑둥치를 힘주어 끌어당겨 마른 우듬지를 땅에 눕혔다. 다른 나무에 기대고 있던 저나 의지가 되어주어야 했던 나무나 모두 편안한 일이 될 것 같다.
이제 이 나무는 땅에 누운 채로 온갖 벌레며 미물들의 아늑한 집이 되다가 풍우에 몸이 녹으면서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무와 땅은 한 몸일지도 모른다. 땅의 기운으로 나고 자라다가 그 기운을 모두 다시 땅으로 가져가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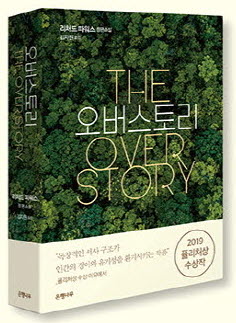
‘나무는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체’라고 하는 소설가 리처드 파워스(Richard Powers 1957~ )는 그의 나무 소설 ‘오버스토리(The Over Story)’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나무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와 열 살 난 딸이 나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기로 한다. 90㎏의 흙을 채운 통에 너도밤나무 열매를 심고 계속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면서 기르다가 열여섯 살이 될 때 나무와 흙의 무게를 재어보기로 한다. 딸은 그 약속대로 나무를 기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 열여섯 살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열여덟 살이 되어 식물학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면서 비로소 통에 자란 나무를 파내어 본다.

무게를 달아보니 나무는 자기보다 무게가 더 나갈 만큼 자랐는데, 토양의 무게는 40~50g 정도 준 것을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였다. 그것으로 모든 나무의 질량은 공기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자신의 실험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만큼 파워스는 나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관심과 지식으로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가 크게 장성해도 흙의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사람을 돌아보자. 모체의 자양을 한껏 받아 태어난 사람은 성장하면서도 부모의 모든 역량을 가져가려 한다. 부모는 그 힘을 대어주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다. 골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자식이 잘 자라 심신이 모두 훌륭하게 되면 큰 보람으로 여긴다. 이처럼 사람의 성장에는 부모의 갖은 희생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다. 사람은 살면서 의식주 간에 많은 물량을 소비해야 한다. 정신적인 생장을 위해서도 많은 부분에 소모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소모와 소비를 위하여 부지런히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마련한 것을 다시 소모하고 소비하는 일을 되풀이하며 고단하게 살아야 한다. 그 고단 때문에 사회의 보편적, 규범적 질서를 무참하게 깨뜨리는 일이 왕왕 일어나기도 한다.
다시 나무를 본다. 나무가 바라는 것은 없다. 오직 원하는 게 있다면 땅과 하늘의 기운일 뿐이다. 공기와 물이 빚어내는 영양물일 뿐이다. 나무는 하늘과 땅에서 그것을 섭취하고 살지만, 나무 때문에 하늘과 땅이 무릅써야 할 일은 없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내어준다. 살아서는 품을 너그러이 내어주고, 죽어서는 몸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새와 바람이 날아 앉으려 하면 언제나 팔을 벌려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 먹이도 기꺼이 내어준다. 혹 그들이 심술을 부릴지라도 말없이 받아주며, 몸에 생채기를 지우는 일이 있어도 변색하지 않는다. 나무는 그들의 자비로운 보금자리가 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지도 모른다.

나무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선 채로 강대나무가 되어 말라가고 있을지라도, 내려앉아 육신을 땅에 붙이고 있을지라도 그냥 어중되게 머무는 게 아니다. 몸 그대로 수많은 생명체의 충실한 영양분이 되고 아늑한 집이 된다. 싱싱한 생명으로 서 있을 때보다 더 오랜 세월을 안기도 한다. 그 세월 끝에 마침내 돌아가는 곳은 제가 뿌리박고 살던 흙이다. 흙이 되면서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한다. 그리하여 새 생명의 집이 되고, 스스로 새로운 생명이 되어 태어난다.
나무는 어찌 그리할 수 있는가. 무엇에게도 바라는 것이 없고, 무엇에도 욕심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무는 나고 살 자리를 가리지 않고, 지위를 탐하지도 않는다. 나무가 더 비옥한 토양을 얻기 위해, 더 청량한 바람을 맞기 위해 애면글면하던가. 더 편안한 자리에서 나기 위해, 더 높은 나무로 살기 위해 다른 이를 넘보던가.

나무는 겸허하다. 나무는 겸허를 맞아 더욱 나무이게 되고, 겸허는 나무에게 와서 더욱 빛이 나게 된다. 나무가 되고 싶다. 바라는 게 없고 탐하는 것이 없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무를 보면 그 겸허가 더욱 우러러 보이는 것은, 내 속이 지금도 욕심으로 차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세상도 지금 온통 탐욕스러운 일들로 들끓고 있다.
오늘도 산을 오른다. 나무를 만나러 오른다.♣(2019.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