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강둑을 걷는다. 날마다 걷는 아침 산책길이지만 날마다 다른 물, 다른 풍경이다. 오늘 물소리는 한껏 여물어져 유리알 쟁쟁이듯 흐르고, 물가의 풀숲에는 함빡 서리가 내려 온 강이 순백의 천지다. 
맑고 푸르게 흐르는 물과 함께 싱그러운 갈맷빛으로 물기슭을 수놓던 강풀들이 어느새 침향색으로 흔들리다가 오늘은 새하얀 서리꽃을 피워내고 있다. 저 꽃 위로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강물이 하얀 꽃 숲을 낭랑히 흘러가다가 보(洑)에 이르러 잠시 걸음을 멈춘다. 어쩌면 저물어가는 세상의 한 해를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려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고인 물의 맑기가 지성으로 닦은 거울 같다.
물오리가 이따금 파문을 지우지만 물은 고요히 깊은 사색에만 잠겨 있는 것 같다. 강둑의 나무들은 그림자를 던지면서도 사뭇 송구하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 걸음을 잡으면서 나에게도 무언가를 돌아보라 하는 것 같다.
내 한 해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던가. 문득 무척도 가물었던 지난여름의 강 모습이 떠오른다. 그 때 강물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듯 안쓰럽게 흐르고, 보에 잠겨있는 물도 바닥을 비추이면서 잿빛 마른 가슴을 애타게 드러내고 있었다.
글쓰기를 사랑하고 시 낭송을 좋아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내 가슴은 가문 지난여름 같다. 이렇다 할 글 한 편 시원스레 쓸 수 없었고, 단 한 사람의 심금이라도 울릴 수 있는 낭송 시 하나 가슴에 담지를 못했다.
마음에 찬 글이 써지지도 않았지만, 어쩌다 세상에 내놓은 글도 얼굴을 붉히게만 했다. 몇 번의 시낭송 콘서트라는 걸 했지만 누가 나의 목소리로 편안을 얻었을까.
 낭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송년회를 가졌다. 지난 한 해 동안 낭송을 사랑하여 해온 일들을 회고하면서 애송시 한 편씩을 낭송하는데, 나는 오세영의 ‘먼 그대’를 외었다. 낭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송년회를 가졌다. 지난 한 해 동안 낭송을 사랑하여 해온 일들을 회고하면서 애송시 한 편씩을 낭송하는데, 나는 오세영의 ‘먼 그대’를 외었다.
“강물은/ 흰 구름을 우러르며 산다./ 만날 수 없는 갈림 길에서/ 온 몸으로 우는 울음…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움에 산다.” 멀리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아름답고, 시인은 늘 그 먼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던가. 글을 쓰는 일이며 낭송하는 일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이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늘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모두들 자기 심정을 담은 시 한 편씩을 낭송한 그 송년의 밤이 참 아름다웠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내가 그리는 모든 것이 참 멀리 있는 것만 같았다. 외롭고도 불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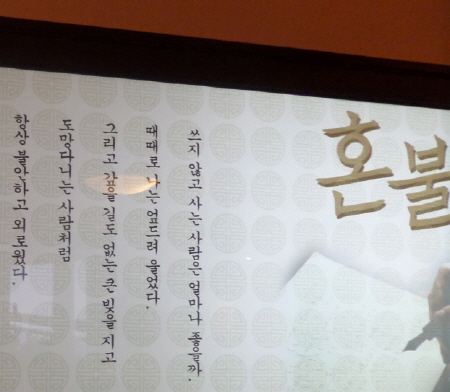
‘혼불’이라는 대작을 남긴 작가 최명희(1947~1998)는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라며 엎드려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갚을 길도 없는 큰 빚을 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처럼 항상 불안하고 외로웠다고 했다.
나는 아직 덜 외롭고, 덜 불안하여 최명희가 되지 못하는 걸까. 그런 글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어느 문화심리학자의 말처럼 ‘격하게 외로워’지고 싶다. 아주 큰 빚쟁이가 되고도 싶다. 그렇게 외로워지지도 못하는 나의 문화적인 자질이 나를 더욱 외롭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쓰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가. 나에게 낭송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다 뿌리치고 싶다. 그 굴레를 벗어 던지고 싶다. 내가 자 연 속을 살겠다고 이 한촌을 찾아 왔듯, 거저 날새 소리 되고 솔바람 소리 되어 오직 자연으로만 살고 싶다. 천재도 없는 사람이 잘 할 줄도 모르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세상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참 민망한 노릇이다. 연 속을 살겠다고 이 한촌을 찾아 왔듯, 거저 날새 소리 되고 솔바람 소리 되어 오직 자연으로만 살고 싶다. 천재도 없는 사람이 잘 할 줄도 모르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세상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참 민망한 노릇이다.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에 25년을 무명 생활을 하다가 노래 한 곡이 히트가 되어 별안간 인기를 얻게 된 어느 가수가 방송국의 초대를 받아 출연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겪었던 고난과 좌절을 토로하는데, 무명 가수의 길이 하도 힘들어 몇 번이나 가수 생활을 포기하려 했고, 한 동안 활동을 접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가수’는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노래’는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 했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 견딜 수 없더란다.
나는 무얼 하는 사람인가? 글 쓰는 사람인가? 낭송하는 사람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 가수의 말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꽂혀오는 것 같다. 맞아, 그렇구나. 나도 ‘글 쓰는 사람’, ‘낭송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글 쓰는 일, 낭송하는 일만은 포기할 자신도 용기도 없다. 그 걸 내치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보에 잠겨 잠시 자신을 돌아보았던 저 물도 제 길을 따라 흘러갈 것이다. 흘러가야 한다. 물은 흘러야 하는 것이니까. 흘러 흘러가다가 어느 바위 틈새로 잦아들지라도, 어디 샛강에 섞여 자신의 자취는 가물거리게 될지라도 흘러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넓고 큰 바다에, 혹은 그 그림자에까지라도 이를 수 있을까.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다만 몇 줄의 글이라도 쓰고 싶다.
‘먼 그대’가 다시 내게로 다가온다.
“바다는/ 하늘을 우러르며 산다./ 솟구치는 목숨을 끌어안고/ 밤새 뒹구는 육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움에 산다.”♣(2015.12.21.)
|